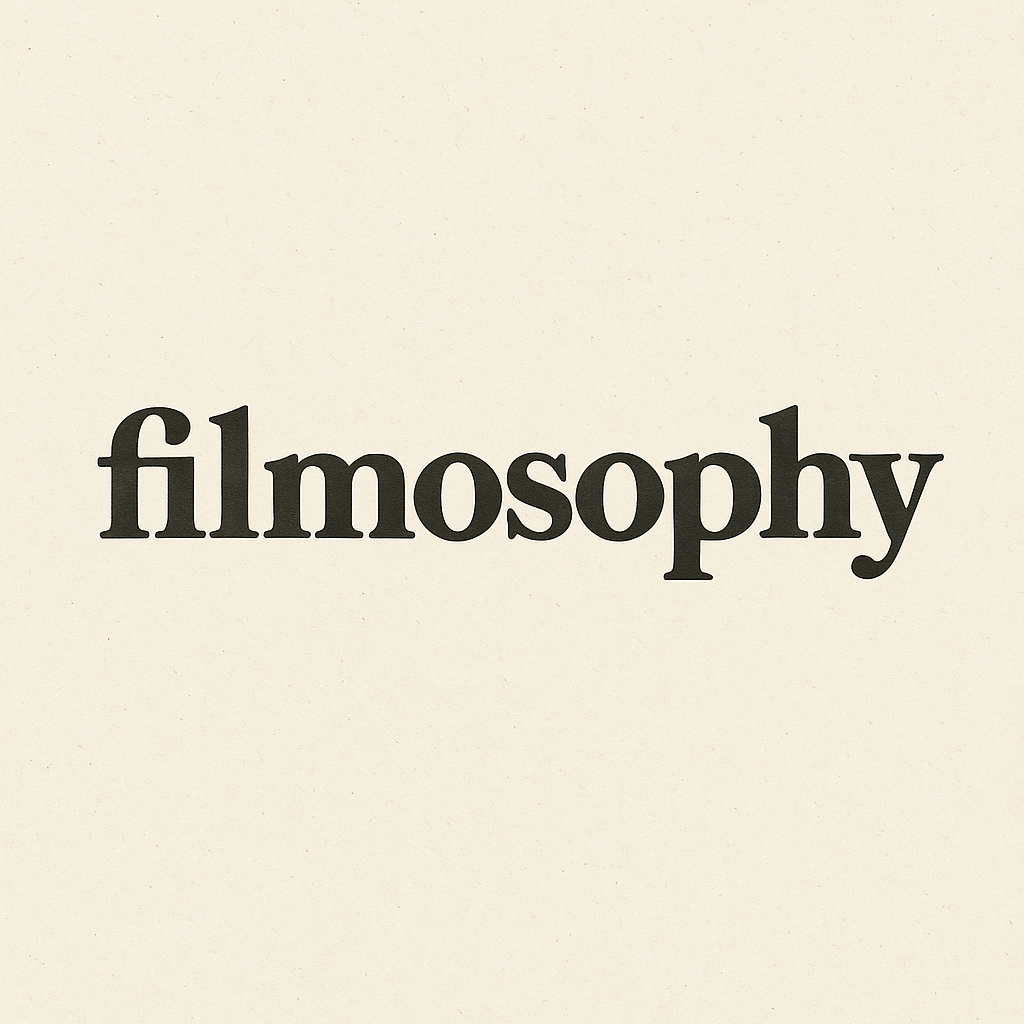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1997년 개봉한 <가타카(Gattaca)>는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미래 사회를 그린 디스토피아 영화다. 영화 속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우월한 '유전적 우성인간(Valid)'과 자연 출생한 '유전적 열성인간(In-Valid)'이 철저히 구분된다. 주인공 빈센트(에단 호크)는 자연 출생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전자 검사 시스템을 속이고 가타카 항공우주국에 들어간다. 영화는 "유전적 우월성이 곧 인간의 가치인가?", "자유 의지는 유전자를 초월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이번 글에서는 <가타카>가 담고 있는 유전적 결정론과 인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분석해본다.

1. 유전적 결정론 vs. 자유 의지 –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영화 속 미래 사회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출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은 좋은 직업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반면, 자연 출생자들은 유전자 열등을 이유로 차별받으며, 낮은 직업군으로 밀려난다. 빈센트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우주 비행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설정은 유전적 결정론(Genetic Determinism)과 연결된다. 유전적 결정론은 "인간의 성격과 능력, 운명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19세기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영화는 이를 비판하며, "인간의 가능성을 유전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자유 개념과도 연결된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본질이 결정된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빈센트는 유전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결국 영화는 "유전자가 인간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한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2. 우생학과 차별 –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영화에서 유전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법적으로는 유전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기업들은 구직자의 혈액, 소변, DNA 샘플을 검사하여 선별 채용을 한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차별받으며, 단순 노동직에만 종사할 수 있다. 빈센트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유전적으로 우월한 제롬(주드 로)의 신분을 빌려 신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속인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우생학(Eugenics)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생학은 "더 나은 유전적 형질을 가진 인간을 선호하고, 열등한 형질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20세기 초, 실제로 우생학은 미국과 독일에서 강제 불임 정책과 인종 차별 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영화는 유전적 차별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이는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초인(Übermensch)’ 사상과도 연결된다. 니체는 "인간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영화 속 사회는 이를 왜곡하여 우월한 유전자만이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빈센트는 진정한 초인이란 유전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간임을 보여준다.
3. 과학 기술과 윤리 – 우리는 어디까지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가?
영화 속에서 부모들은 유전자 편집을 통해 더 나은 아이를 설계하는 ‘맞춤형 아기(Designer Baby)’를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유전자를 선택하여 질병 위험을 낮추고, 지능과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든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Cas9)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을 통해 특정 유전병을 제거하거나, 유전적 특성을 조작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 논쟁을 불러온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지능, 외모, 신체 능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간의 다양성과 평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전체주의 철학과도 연결된다. 아렌트는 "사회가 특정 기준을 강요하며 개인의 선택을 억압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속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전적 기준에 의해 철저히 계급이 나뉘어 있다. 영화는 과학 기술이 인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차별과 억압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결론: <가타카>가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
영화 <가타카>는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다. 이 작품은 유전자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라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한가?
- 우생학적 사고방식이 초래할 사회적 차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과학 기술은 인간을 발전시키는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만드는가?
결국 영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빈센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은 유전자가 아닌, 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