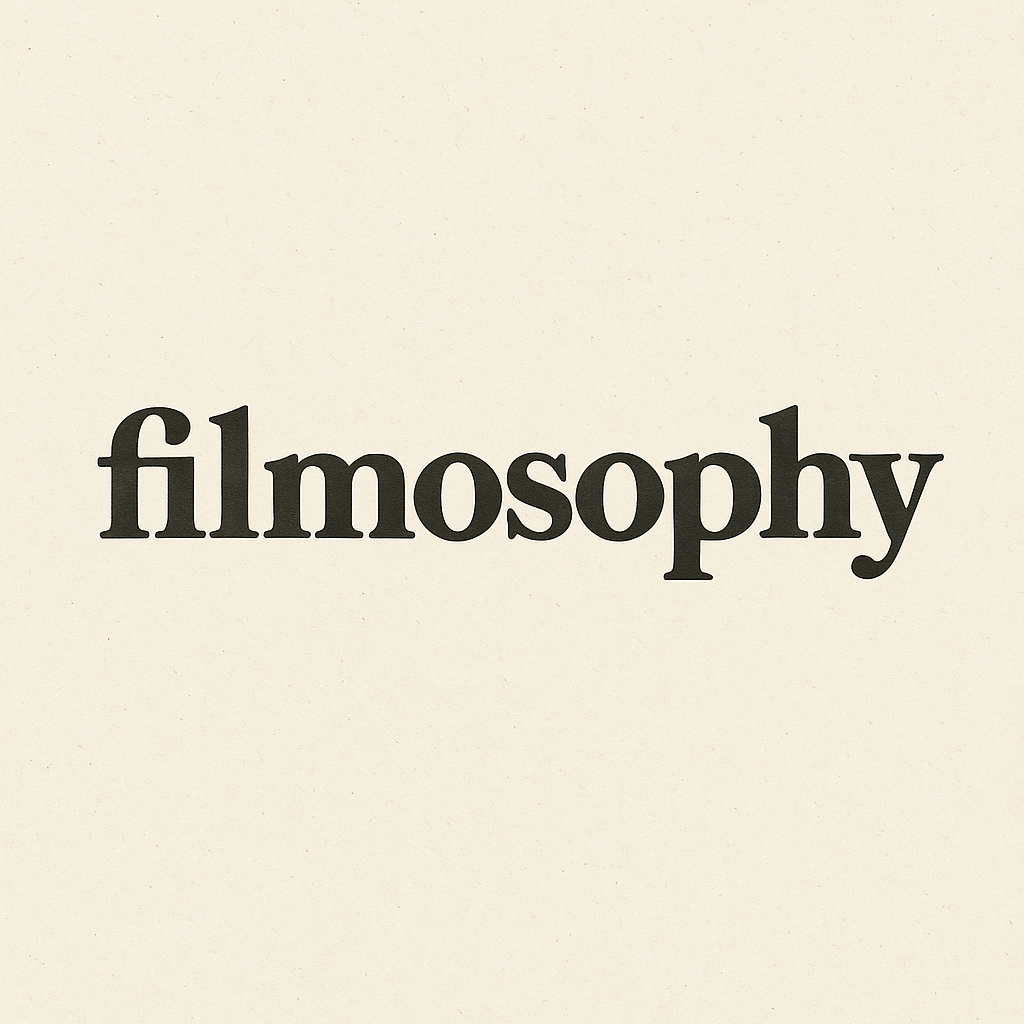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앳 이터너티스 게이트(2018)와 러빙 빈센트(2017)는 같은 인물, 빈센트 반 고흐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한쪽은 고흐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심리와 감정을 따라가며 인물 자체를 탐구하고, 다른 한쪽은 그의 회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주변의 시선과 기억을 통해 인물을 그려낸다.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영화로 표현할 때,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것인가? 두 영화는 그 질문에 정반대의 방식으로 응답한다.
1. 인물 중심 vs 예술 중심: 고흐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앳 이터너티스 게이트는 윌렘 대포가 연기한 고흐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한다. 영화는 고흐의 정신 상태, 감정 변화, 사회와의 단절 등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때로는 그의 시선으로 직접 보여준다. 그의 걸음걸이, 숨소리, 붓을 드는 손의 떨림까지 카메라는 놓치지 않으며, 고흐라는 사람의 ‘내부’를 보는 데에 몰두한다. 특히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세상과 하나 되는 듯한 평화를 느끼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는 극단적인 불안과 고독에 시달린다. 이 영화는 고흐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했는지를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체험’하게 만든다.
반대로 러빙 빈센트는 고흐라는 예술가가 남긴 ‘그림’에서 출발한다. 영화 전체는 고흐의 대표적인 유화 130점을 기반으로, 수천 장의 유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한다. 줄거리는 고흐의 죽음 이후, 아르망이라는 우편배달부가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탐색하며 고흐를 알던 여러 인물을 인터뷰하는 형식이다. 이 영화의 고흐는 주인공이지만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의 그림,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점차 실루엣이 만들어진다. 그는 완전히 이해되거나 정의되지 않는 존재로 남지만, 그의 예술을 통해 영원히 살아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2.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 연기를 통한 몰입 vs 이미지가 전하는 울림
앳 이터너티스 게이트에서 윌렘 대포는 눈빛, 표정, 침묵, 혼잣말 등을 통해 고흐의 내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그는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인간으로서의 외로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고흐의 불안정한 감정선을 아주 섬세하게 연기한다. 영화는 이러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사보다 표정, 시선, 호흡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의존한다. 관객은 고흐와 함께 숨 쉬며, 그의 고통을 ‘느낀다’. 카메라는 종종 극도로 클로즈업되며, 관객과 인물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해 감정을 직접 전달받게 한다.
러빙 빈센트는 감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 영화는 인물의 직접적인 감정보다, 고흐의 그림 자체가 말하도록 한다. 별이 빛나는 밤의 휘몰아치는 하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황량함, 노란 집의 고요함 속에서 고흐의 삶과 감정은 말없이 살아 숨 쉰다. 회화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비교적 절제되어 있으며, 감정은 전체 화면의 색채와 리듬을 통해 전달된다. 이것은 마치 고흐의 그림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듯한 체험이다. 영화는 '감정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공간'을 제공한다. 보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3. 시각적 언어의 차이: 고흐의 시선을 ‘연출’할 것인가, ‘재현’할 것인가
앳 이터너티스 게이트는 영상 언어를 통해 고흐가 ‘어떻게 세상을 보았는가’를 연출한다. 화면은 자주 흔들리고, 색이 뒤틀리며, 프레임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모든 연출은 고흐의 시각적 불안정성과 감정적 동요를 시각화한 것이다. 영화의 색감도 강렬하고 거칠며, 붓 터치처럼 불균형한 구성과 색의 충돌을 통해 그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표현한다. 이 영화는 고흐가 ‘보았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흐가 ‘어떻게 느꼈는가’를 시각적으로 해석해 재창조한다.
반대로 러빙 빈센트는 고흐의 시각적 언어를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한다. 원화에 기반한 배경과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실사보다도 더 고흐적이다. 실제 유화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인물과 배경은, 고흐의 화풍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감각을 제공한다. 각각의 장면은 고흐의 그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회화의 구조와 색, 붓 터치까지도 충실하게 따라간다. 이는 단지 고흐의 시각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흐의 세계를 직접 ‘걷게’ 한다. 영화는 예술가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만든 세계에 관객을 초대한다.
결론: 고흐를 기억하는 두 방식, 두 개의 예술적 대답
앳 이터너티스 게이트와 러빙 빈센트는 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영화가 예술가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한쪽은 연기와 연출을 통해 그의 심리를 시청각적으로 체험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그의 예술 세계를 그대로 복원하여 그 속에서 관객이 감정을 읽어내도록 한다. 전자는 내면과 감정의 심화이며, 후자는 시각과 기억의 집합체다. 이 두 영화는 모두 고흐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어떤 이는 고흐의 고독한 눈빛을 통해 예술가의 고통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그의 그림 속 들판과 하늘을 통해 예술의 영원을 체험한다. 두 영화 모두 고흐를 위대한 예술가로 만드는 요소—고통, 시선, 기억, 사랑, 그리고 색채—를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 간다. 그래서 우리는 고흐를 잊지 않는다. 그의 삶이든, 그림이든, 두 작품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영원히 살아 숨 쉬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