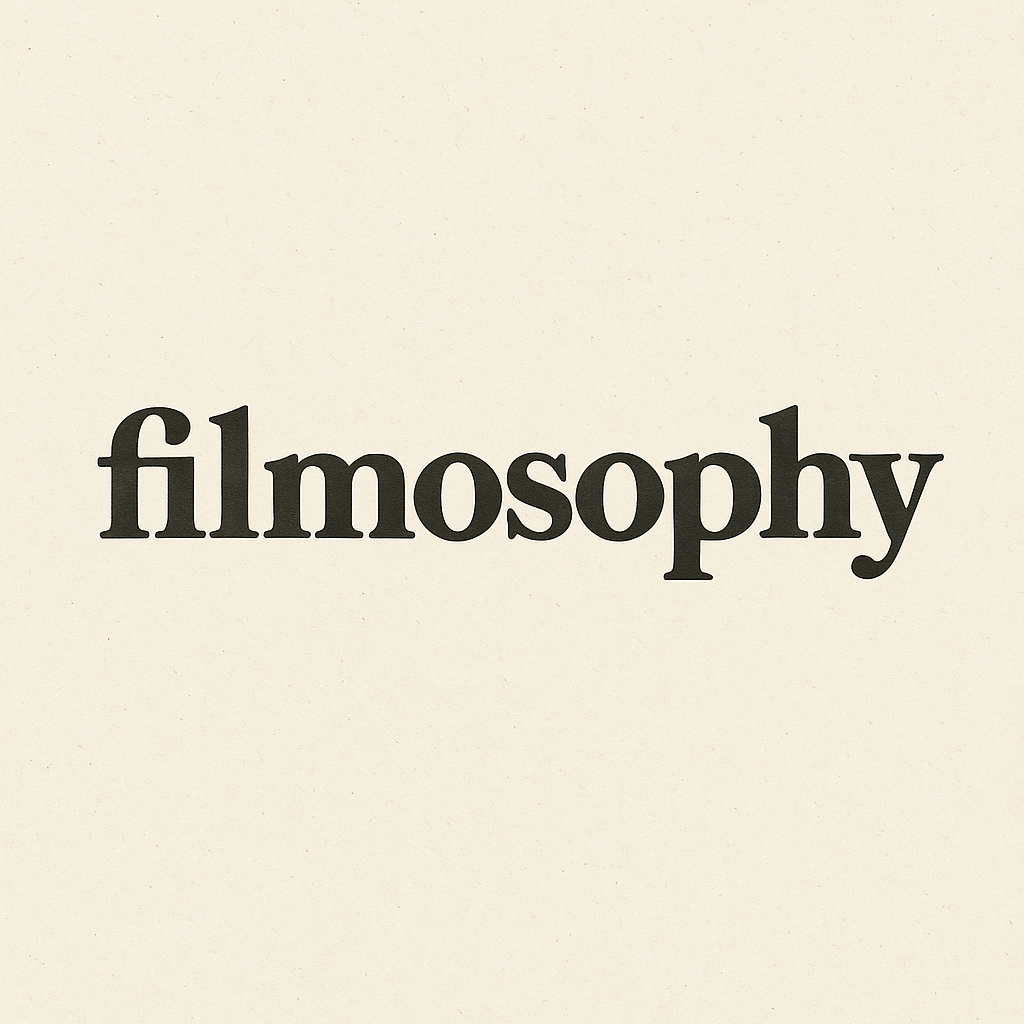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클로이 자오(Chloé Zhao) 감독의 <노매드랜드(Nomadland, 2020)>는 단순한 로드무비가 아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 정착과 떠남의 의미,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영화의 주인공 펀(프란시스 맥도먼드)은 경제적 붕괴로 인해 집을 잃고, 밴에서 생활하며 이곳저곳을 떠도는 현대 유목민이 된다. 그녀는 한때 속했던 도시와 가족을 뒤로한 채, 도로 위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다. 하지만 그녀의 떠남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영화는 그녀의 여정을 통해 정착과 떠남,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인간의 소속감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유도한다.
1. 인간은 반드시 정착해야 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착하는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집을 사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펀은 이와 반대로 떠돌며 살아가기로 선택한다. 그녀는 정착하지 않는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로운 삶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려 한다. 그녀에게 정착은 단순한 물리적 거주가 아니라, 자신이 속할 곳을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념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자연 상태 개념과 연결된다. 루소는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한받게 되었으며, 원래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 펀은 기존의 사회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탐색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하지만 그녀의 떠남은 단순한 자유의 추구가 아니라, 정착의 필요성과 떠남의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반드시 정착해야 하는가?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가? 영화는 정착과 떠남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임을 보여준다.
2. 공동체와 개인,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펀은 혼자 떠돌지만, 도로 위에서 만난 또 다른 노매드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의 지혜를 공유한다. 하지만 결국 펀은 다시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며, 계속해서 길 위의 삶을 이어간다. 그녀는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이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혼자 떠나는 길을 선택한다.
이것은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나와 너’ 개념과 연결된다. 부버는 인간이 단순히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보았다. 펀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다시 혼자가 되는 선택을 한다. 그녀에게 공동체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인으로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영화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집단에 속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개인의 삶도 의미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개인주의를 찬양하지 않는다. 펀은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 위안을 얻지만, 결국 그녀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것은 혼자 떠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3. 떠남은 상실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펀의 떠남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과거의 삶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인지에 대한 질문이 영화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
이 개념은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영원회귀’와 연결된다. 니체는 인간이 같은 삶을 반복해야 한다면,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은 떠남을 반복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되묻는다. 그녀는 떠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 역시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떠남은 상실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는가? 영화는 떠남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떠남이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떠남 속에서도 정착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노매드의 삶은 선택인가, 생존인가?
영화에서 펀을 비롯한 많은 현대 유목민들은 자발적으로 노매드가 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길 위의 삶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계절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다. 노매드의 삶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고된 노동이 동반된다.
이러한 현실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노동과 삶 개념과 연결된다. 아렌트는 인간의 삶이 노동(labor)과 작업(work)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속 노매드들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 삶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노매드의 삶은 진정한 자유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인가? 영화는 떠남이 항상 낭만적이지만은 않으며, 때때로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노매드랜드>가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
영화 <노매드랜드>는 단순한 여행 영화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정착과 떠남의 의미,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영화는 인간은 반드시 정착해야 하는가, 공동체와 개인 중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떠남은 상실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그리고 노매드의 삶은 선택인가 생존인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영화는 정착과 떠남이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없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