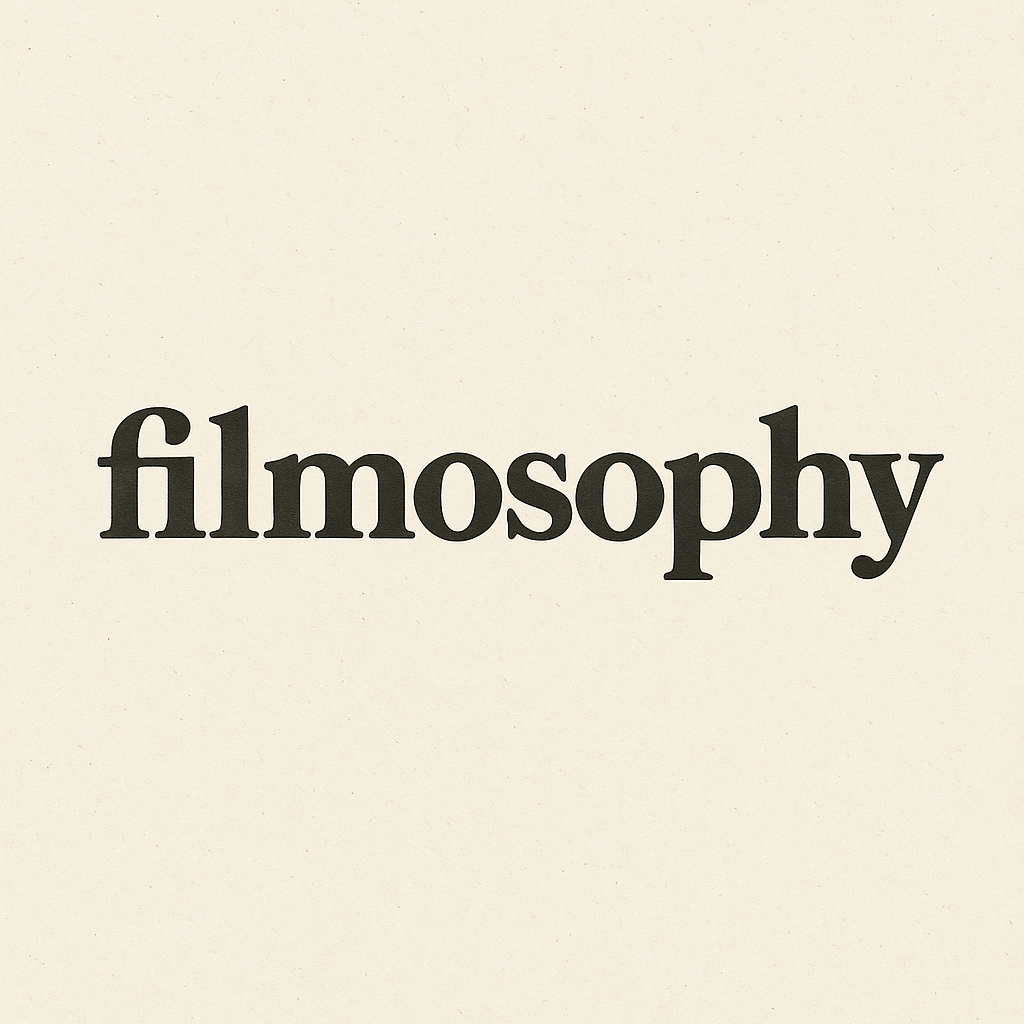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와 더 배트맨(2022)은 모두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드는 작품이다. 전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혼돈과 폭력의 시대를 담담하게 바라보며, 후자는 정의의 이름으로 악에 맞서려는 고뇌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장르와 톤을 가졌지만, 공통적으로 ‘악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게 해답 아닌 해답을 제시한다. 하나는 악을 설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다른 하나는 악에 맞서 싸우는 존재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1. 설명할 수 없는 악 vs 정체를 추적하는 악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등장하는 안톤 쉬거는 어떤 감정이나 목적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존재다. 그는 돈이든 원한이든 명분이 아닌, 단지 ‘자신의 방식’에 따라 움직인다. 동전을 던져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장면은 그가 도덕이나 감정이 아닌, 냉혹한 확률과 자기 기준만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관객은 쉬거의 악행에 논리나 배경을 기대하지만, 영화는 이를 철저히 배제한다. 그는 악이 ‘존재 자체로 설명될 수 없다’는 개념을 체화한 캐릭터다. 반면, 더 배트맨의 리들러는 매우 구체적인 동기와 논리를 가진 악당이다. 그는 고담시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폭로하고 처벌하며, 자신이 행하는 폭력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는다. 그의 퍼즐은 배트맨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정의란 무엇인가?”, “너는 누구 편인가?” 리들러의 악은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더 배트맨은 악의 정체와 배경을 파헤치며, 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두 영화는 악을 정의하는 방식부터 극명하게 다르다. 하나는 설명 불가한 존재로, 다른 하나는 시스템의 그림자로 등장한다. 이는 우리가 악을 받아들이고 대면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조적 시선이다.
2. 무력한 정의 vs 고뇌하는 정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보안관 벨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악을 막을 수 있는가?” 그는 영화 내내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하며, 쉬거를 쫓지도, 막지도 못한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절망 속에서 경찰직을 그만두고 은퇴한다. 벨의 존재는 ‘정의가 더 이상 악에 대항할 수 없는 시대’의 상징이다. 악이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세상에서 그는 그저 낡고 무기력한 이상주의자일 뿐이다. 반대로 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길 자처한다. 그는 폭력과 두려움을 무기로 악당을 응징하지만, 리들러와의 대결을 통해 그 방식이 또 다른 악을 낳았음을 자각한다. "나는 복수다"라고 외치던 그가 마지막에는 "나는 희망이다"로 변화하는 서사는, 정의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 또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함을 말한다. 배트맨은 악을 끝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이처럼 정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의 대비는 뚜렷하다. 벨은 뒤처지는 시대 속에서 물러서는 자이고, 배트맨은 상처 입고 무너지면서도 스스로를 새로 규정하는 자다. 전자는 체념을, 후자는 반성과 진화를 보여준다.
3. 현실주의와 희망주의, 악을 대하는 영화적 태도
두 영화는 각각의 스타일과 결말을 통해 ‘악에 대한 영화적 태도’를 보여준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극도로 절제된 연출, 정적인 구도, 불협화음 없는 음향 등을 통해 현실에 악이 존재하는 무게를 무심하게 보여준다. 감정적인 낙관도, 서사적 보상도 없다. 쉬거는 처벌받지 않으며, 주인공은 아무런 승리도 얻지 못한 채 퇴장한다. 이는 코엔 형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세상은 단순한 정의·악의 구도로 설명되지 않으며, 악은 설명할 수 없이 존재한다는—를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반대로 더 배트맨은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몰입감 높은 연출로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암울하고 폭력적인 세계 속에서 브루스는 빛을 찾아 나서며, 마지막 장면에서는 구조 헬기에서 사람들을 구하며 손을 내민다. 카메라는 그를 ‘두려움의 상징’에서 ‘빛 속의 안내자’로 천천히 전환시킨다. 고담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선택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냉소적 현실주의에 가까운 반면, 더 배트맨은 고통을 통과한 끝에 도달하는 희망주의의 세계에 더 가깝다. 이는 단지 스토리 차원이 아니라, 감독의 세계관과 영화가 관객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차이다.
결론: 악을 마주하는 두 개의 방식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더 배트맨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악과 정의를 해석한다. 하나는 ‘악은 설명할 수 없으며, 때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냉정한 메시지를 남기고, 다른 하나는 ‘악은 우리가 반성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전자는 체념과 허무 속에서 악을 응시하고, 후자는 고통과 대면하며 그 끝에 변화를 시도한다. 두 영화를 본 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악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배트맨은 그것에 맞서는 의지를 이야기한다. 두 작품은 같은 질문을 던지되, 전혀 다른 답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서로를 비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