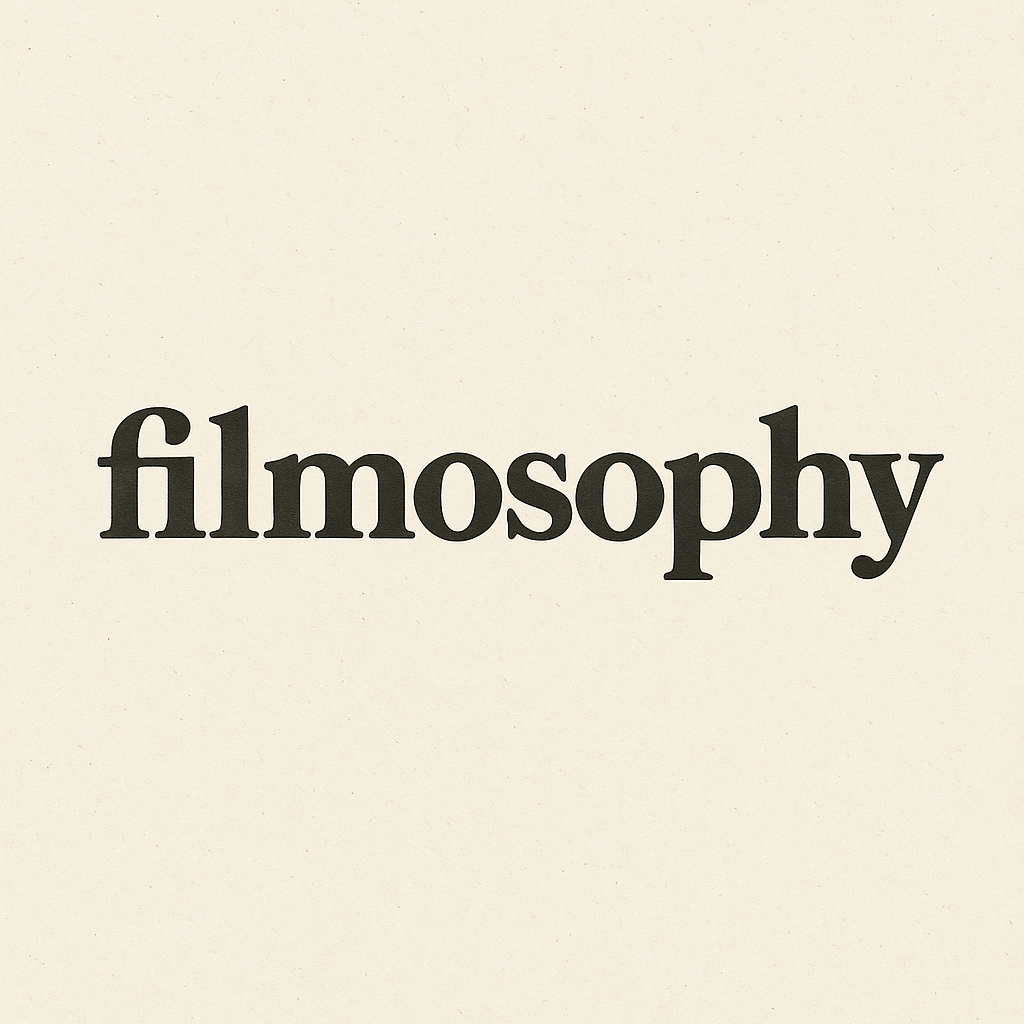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조너선 글레이저(Jonathan Glazer) 감독의 <언더 더 스킨(Under the Skin, 2013)>은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다. 이 작품은 인간성과 타자성의 경계,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영화는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하는 이름 없는 외계 존재가 스코틀랜드의 거리를 떠돌며 남성들을 유인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녀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이나 도덕적 기준 없이 단순한 본능과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려 하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된다.
1. 인간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영화의 주인공은 외형적으로는 인간과 동일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냥꾼처럼 행동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 점차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인간성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적인 조건인가, 아니면 감정과 사고의 능력인가?
이 질문은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와 연결된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의식과 사고를 가짐으로써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점차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단순히 신체적 형태로 정의될 수 있는가, 아니면 사고와 감정을 통해 인간성이 결정되는가? 영화는 우리가 인간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2. 타자는 왜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는가?
영화에서 주인공은 인간 남성들을 유인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녀가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경계심을 풀고 다가온다. 그러나 주인공이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인간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그녀를 배척하거나 공격한다.
이것은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의 철학'과 연결된다. 레비나스는 우리가 타인을 만났을 때, 그것이 친숙한 존재인지 낯선 존재인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영화 속 인간들은 주인공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만, 그녀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거부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과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는가? 인간 사회는 타자를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가? 영화는 타자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와 배척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3. 감정과 공감은 인간성을 증명하는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처음에는 감정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 세계에서 점차 동정심과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녀가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남성을 유인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망설임을 보이는 순간, 그녀는 인간성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감정 철학과 연결된다. 흄은 인간의 도덕과 존재는 이성보다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인간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논리적 사고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의미인가? 공감은 인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가? 영화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한 외형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결론: <언더 더 스킨>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
영화 <언더 더 스킨>은 단순한 SF 스릴러가 아니라, 인간성과 타자성의 경계,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감정과 공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영화는 인간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타자는 왜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는가, 감정과 공감은 인간성을 증명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