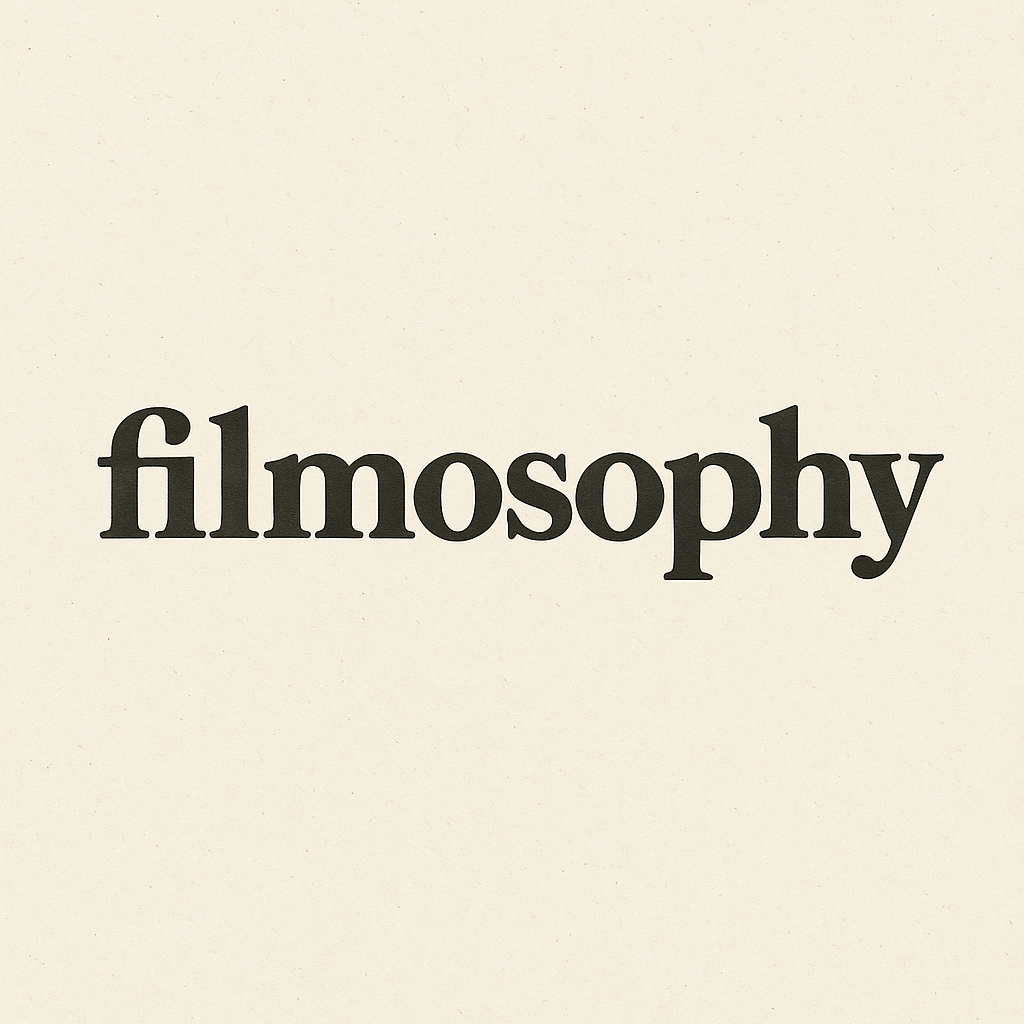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1950)은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작품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다르게 묘사하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라쇼몽 효과(Rashomon Effect)’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강렬한 서사 기법을 사용한 이 영화는, 인간의 기억과 인식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글에서는 <라쇼몽>이 제기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인간이 과연 객관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본다.

1. ‘라쇼몽 효과’와 진실의 상대성
영화 <라쇼몽>은 한 여성의 강간과 한 남성의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문제는 같은 사건을 목격한 각 인물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한다는 점이다.
- 산적 다조마루(미후네 토시로)는 자신이 여성을 유혹하고 정정당당한 결투 끝에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한다.
- 아내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후, 남편이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기절했다고 말한다.
- 죽은 남편의 영혼(무당을 통해 전달됨)은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도망가려 했으며, 이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증언한다.
- 사건을 목격한 나무꾼은 그 누구의 말도 진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두 남자가 겁쟁이처럼 싸웠고, 아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남편이 죽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각각의 증언이 모두 다르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구조를 ‘라쇼몽 효과’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니체의 인식론적 상대주의와 연결된다.
- 니체는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관점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 <라쇼몽>은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며, 우리가 믿는 ‘객관적 진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낸다.
- 즉,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며, 절대적인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법학, 저널리즘,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 법정에서도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언론 역시 특정한 시각을 반영해 보도할 때가 많다. 결국, <라쇼몽>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하나의 해석일 뿐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2. 인간은 왜 진실을 왜곡하는가? – 심리학적 접근
<라쇼몽>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여러 시점에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인물들이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억을 왜곡하거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낸다.
-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적 다조마루는 자신을 강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싸움을 정당한 결투로 포장한다. 반면, 아내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서사를 다르게 전달한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이론과도 관련이 있다.
- 인간은 죄책감이나 불안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부정(Denial)’이나 ‘합리화(Rationalization)’를 사용한다.
- 영화 속 인물들 역시 이러한 방어기제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사건을 기억한다.
즉,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3. 구로사와 아키라가 말하는 인간 본성
구로사와 아키라는 <라쇼몽>을 통해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무꾼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아기를 안고 가기로 결심한다.
- 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희망과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구로사와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
이는 칸트의 도덕 철학과 연결된다.
- 칸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도덕적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이성을 가졌다고 보았다.
- 나무꾼의 선택은 인간의 본성이 단순히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구로사와는 인간의 진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결론: ‘진실’은 존재하는가?
영화 <라쇼몽>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진실을 알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담겨 있다.
- 우리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 인간은 왜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는가?
- 진실이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결국, <라쇼몽>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해석하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는 영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