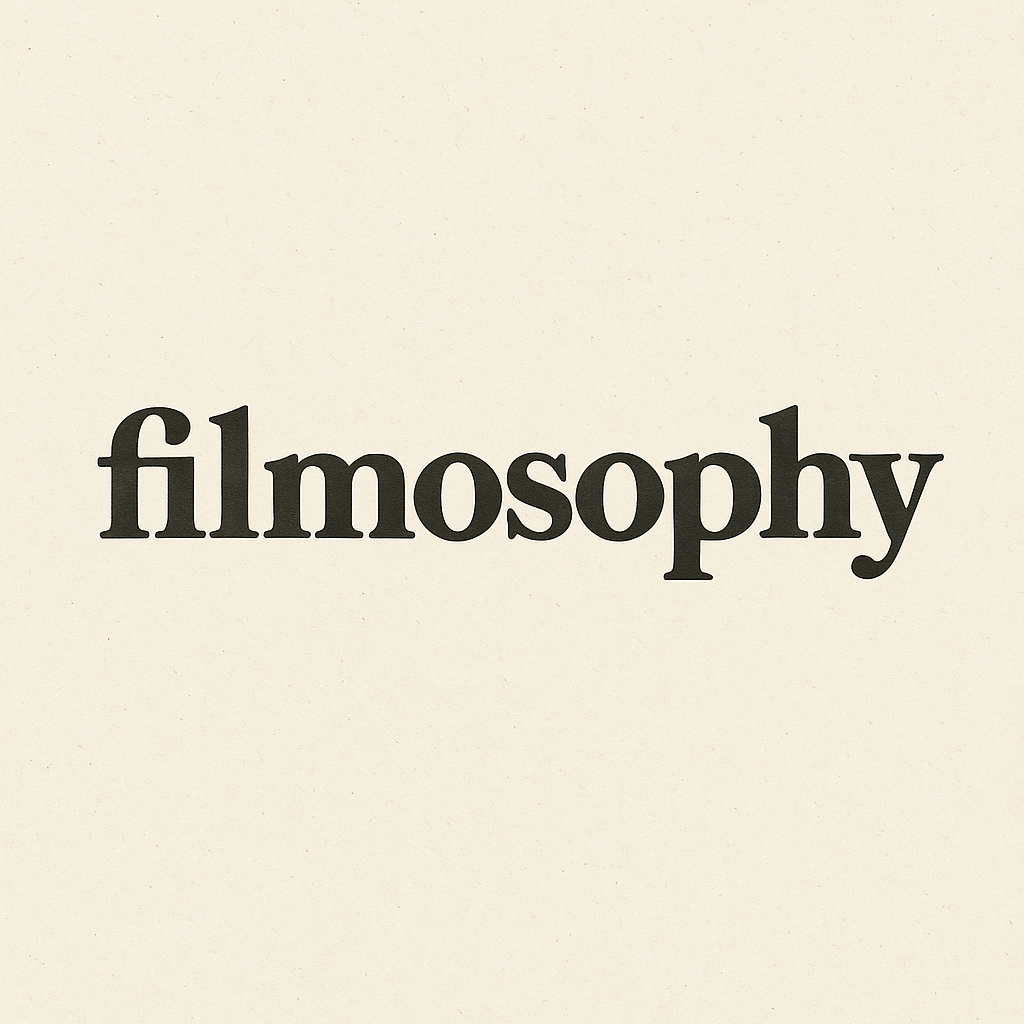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조커〉와 〈택시 드라이버〉는 각각 2019년과 1976년에 개봉한 작품이지만, 시대를 초월한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가?” 두 영화 모두 한 남자의 외로움과 소외가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다루며, 관객에게 불편하지만 묵직한 감정과 사회적 질문을 남긴다. 이 글에서는 아서 플렉과 트래비스 비클, 두 인물이 왜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연출을 통해 분석해본다.
1. 조커와 택시 드라이버에서 고립된 남자의 일상, 반복되는 침묵 속 절규
〈조커〉의 아서 플렉은 정신 질환을 앓으며 코미디언을 꿈꾸는 남자다. 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로 치료를 중단당하고, 일자리에서도 쫓겨난다. 거리에서 구타당하고, 지하철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남자들을 죽이게 된 계기 또한 단순한 자의식의 폭발이 아니라, 그간 쌓여온 좌절의 누적이다. 이 모든 과정은 그를 점차 사회로부터 밀어내고, 결국 스스로를 ‘조커’라는 새로운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택시 드라이버〉의 트래비스 비클은 베트남 전쟁 후유증을 겪는 외로운 청년이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뉴욕 거리를 택시로 떠돈다. 세상과 단절된 그의 삶은 TV, 성인극장, 총기,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피해망상으로 채워진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의 ‘더러움’을 정화하고자 하며, 그 폭력성은 ‘정의’라는 이름을 걸치고 점점 파괴적으로 변해간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이 원한 고립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점점 외면하고 침묵해온 결과다. 조커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버려졌듯, 트래비스 역시 전쟁 영웅에서 사회의 찌꺼기로 밀려났다. 그들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공간을 끝내 찾지 못하고, ‘폭력’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2. 폭력의 방식, 그리고 대중이 보내는 왜곡된 환호
〈조커〉에서의 폭력은 우발적인 분노로 시작되지만, 곧 사회 구조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진다. 아서가 지하철에서 부유층 청년들을 살해한 후, 그 행동은 의도치 않게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그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점차 자신의 폭력이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믿기 시작한다. 이는 개인의 분노가 대중의 분노와 결합될 때, 그것이 어떻게 급진적인 상징으로 부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의 폭력은 완전히 개인적인 환상에서 비롯된다. 그는 매춘에 이용되는 소녀 아이리스를 구하려는 행동을 정당화하며 무장하고, 매음굴에 쳐들어가 대량 학살을 벌인다. 놀랍게도 영화 말미에서 그는 ‘아이를 구한 영웅’으로 미디어에 포장된다. 사회는 그의 진짜 의도와 폭력성을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영웅 서사를 만들어낸다. 조커와 트래비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만, 공통적으로 ‘예외적 존재’에서 ‘사회적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 과정은 관객에게 불편함을 안긴다. 왜곡된 시선, 폭력을 미화하는 사회, 개인의 절규가 집단의 열광으로 바뀌는 순간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폭력으로 말하려 했던 것은 자신을 이해해 달라는 외침이었고, 사회는 그 외침을 무책임하게 영웅담으로 소비해버린다.
3. 인물의 연출과 미장센, 도시가 만든 괴물
〈조커〉의 아서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도시를 배회한다. 지하철, 계단, 거리, 모두가 그에게는 연극 무대처럼 보인다. 특히 계단에서 조커로 완전히 각성한 뒤 춤을 추는 장면은, 슬픔과 해방감, 광기가 섞인 절정의 퍼포먼스다. 도시의 무관심한 배경과 대비되는 그의 과장된 몸짓은 ‘드디어 자신만의 쇼를 시작한 존재’로서의 선언처럼 보인다. 〈택시 드라이버〉의 트래비스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거리의 매춘, 폭력, 약물, 그리고 인간관계의 피로함이 쌓이며 그는 점점 괴물이 되어간다. 미장센은 철저히 차갑고 절제되어 있으며, 트래비스의 얼굴은 늘 어둠 속에서 카메라에 의해 천천히 드러난다. 군복을 입고 머리를 민 채 거울을 보며 “You talkin' to me?”라고 외치는 장면은, 그가 더 이상 현실 속 인물이 아니라, 자기 안의 환영과 싸우는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두 영화 모두 ‘도시’를 하나의 인격처럼 그려낸다. 뉴욕과 고담은 인물들을 압박하고 왜곡시킨다. 인간성을 박탈하는 사회적 구조, 무관심한 군중, 파편화된 공동체 속에서 두 남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무책임이 만든 산물로 봐야 한다.
결론: 괴물은 어디서 오는가 – 개인의 비극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조커〉와 〈택시 드라이버〉는 모두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석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왜곡된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폭력은 자기 과시가 아닌 마지막 수단이며, 그 안에는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의 절규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영웅’ 또는 ‘악마’로 단순화해 버린다. 이 두 영화는 묻는다. "누가 괴물을 만들었는가?" 괴물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된 무관심 속에서 탄생한다. 우리 역시 그런 누군가를 스쳐 지나친 적은 없는가. 이 두 작품은 단순한 캐릭터의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