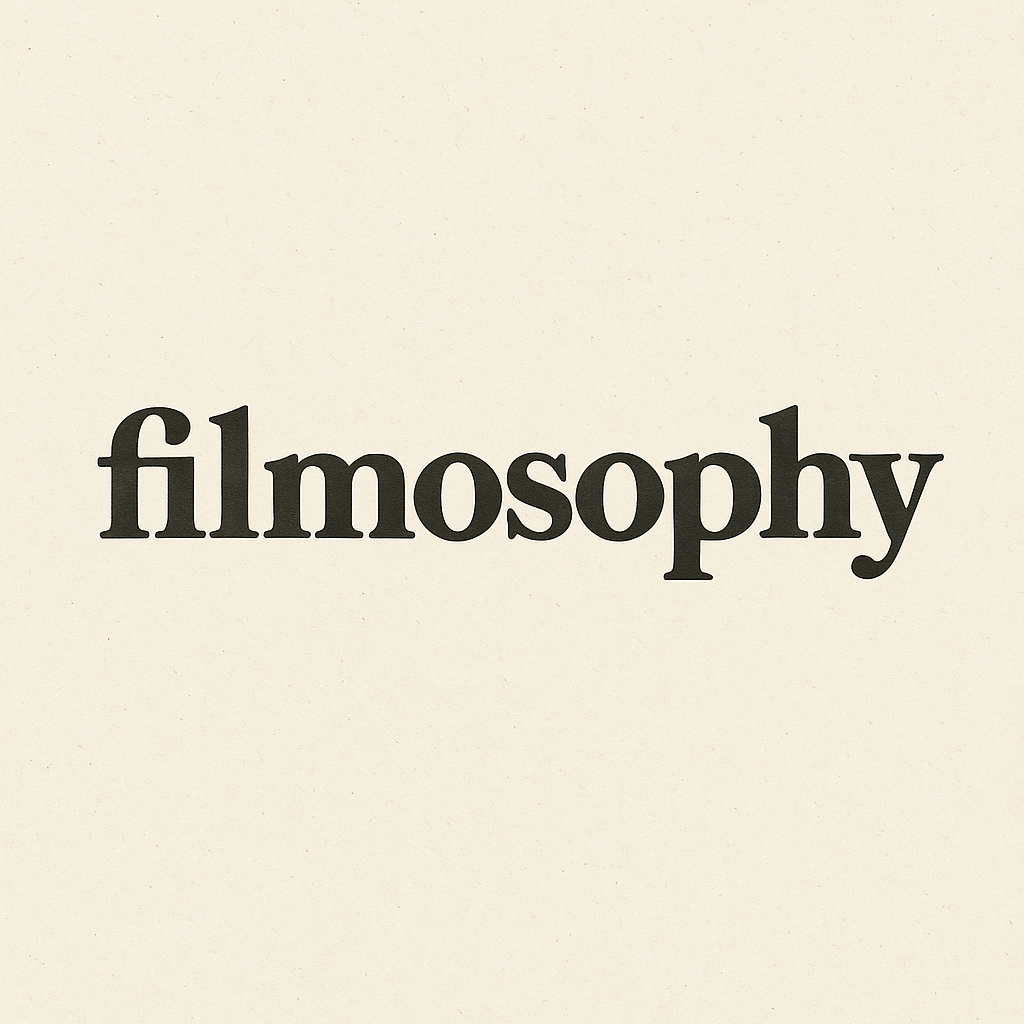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케빈에 대하여(2011)는 린 램지 감독이 연출하고,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심리 스릴러 영화다. 이 작품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시선으로,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소년 케빈의 성장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린다. 특히, 어머니 에바 역을 맡은 틸다 스윈튼의 깊이 있는 연기와 함께, ‘악은 타고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관객에게 깊은 충격을 안긴다. 영화는 단순히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한 감정, 사회적 책임,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을 탐구한다.
1. 악은 타고나는가? 케빈의 본성과 양육의 영향
케빈은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불안정하고 기이한 면모를 보인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어머니 에바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울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 에바는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고, 케빈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진다. 이러한 장면들은 ‘악’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 실패가 원인인지에 대해 관객의 고민을 유도한다. 영화 속에서 케빈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교묘하게 순진하고 착한 아이로 가장하지만, 에바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공격적이고 냉소적이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을 교묘히 조종하며, 심지어 동생 셀리아에게도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케빈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악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뒤틀린 감정이 자라난 것인지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또한, 영화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에바는 케빈을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질감과 공포를 감추지 못한다. 케빈은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의 충돌은, 악이 유전적 본성인지 아니면 양육의 실패인지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되묻게 만든다.
2. 어머니의 죄책감, 폭력 이후 남겨진 고통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 케빈이 아니라 어머니 에바다. 에바는 케빈의 끔찍한 범죄 이후 폐허 같은 삶을 살아간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범죄자의 엄마로 낙인찍혀 조롱과 폭행을 당하고, 집은 붉은 페인트로 더럽혀져 있다. 하지만 에바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과거를 회상하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에바는 케빈을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유로운 삶을 즐기던 그녀에게 임신은 족쇄처럼 느껴졌고, 모성애를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했다. 케빈이 성장하며 점점 더 반항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갈 때, 에바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 이 죄책감은 사건 이후 더욱 심화되어, 에바 자신이 케빈의 악을 만들어냈다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진다. 특히, 케빈이 학교에서 저지른 끔찍한 범죄 이후에도 에바는 아들을 버리지 못한다. 케빈이 수감된 교도소를 방문하며 여전히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단순히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에바는 아들의 악행이 자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그 고통을 끝까지 짊어지고 간다.
3. 사회적 책임과 공포, 케빈 이후의 세계
영화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삶이 계속됨을 보여준다. 에바는 남편과 딸을 모두 잃고도 살아가야 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폭력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간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범죄자의 가족으로 취급하며, 에바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책임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에바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무력함과 양육의 실패를 비판할 수도 있다. 영화는 범죄자의 가족이 사회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파괴하는 사건의 파급력을 강조한다. 또한, 에바와 케빈의 마지막 대화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의 절정을 보여준다. 에바는 케빈에게 이유를 묻고, 케빈은 단순히 “예전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라고 답한다. 이 대사는 악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케빈조차 자신의 행동 이유를 모른다는 불가해성을 암시한다. 이는 영화의 공포를 더욱 심화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결론: 악의 본질을 묻는 불편한 진실
케빈에 대하여는 악의 근원을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관객에게 해답 없는 질문을 던진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죄책감, 사회의 시선과 개인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 영화는, ‘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지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본 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악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케빈에 대하여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무게와 부모라는 존재의 고통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