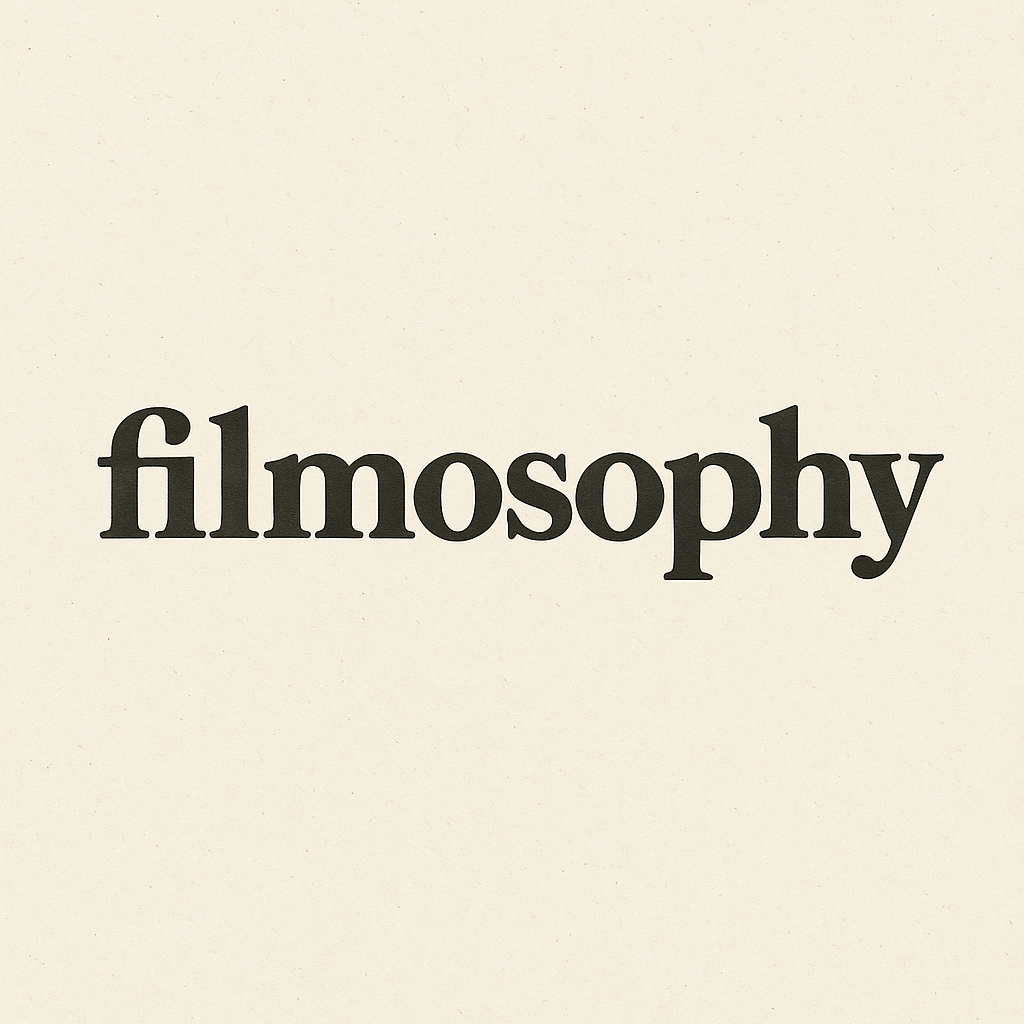티스토리 뷰

루벤 외스틀룬드(Ruben Östlund)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Triangle of Sadness, 2022)>는 단순한 풍자 코미디가 아니다.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권력은 언제 뒤바뀌는지, 그리고 인간은 정말 평등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패션 모델인 칼과 야야가 초호화 크루즈에 승선하면서 시작된다. 이곳에는 억만장자, 무기상, 인플루언서 등 부유층이 가득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힌다. 배가 난파된 후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평소에는 하층 계급이었던 청소부 아비게일이 생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권력자가 된다. 영화는 이 과정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방식과 인간 본성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1. 계급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영화의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다. 모델인 칼은 외모를 이용해 사회적 위치를 얻으려 하지만, 부유한 야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크루즈에서는 승객과 승무원 간의 뚜렷한 계급 구분이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상류층을 위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개념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계급 이론과 연결된다. 마르크스는 계급이 생산수단(자본)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고 보았다. 영화 속 크루즈는 바로 이 구조를 반영하며, 자본을 소유한 자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그렇다면 계급은 단순히 돈과 권력으로만 결정되는가? 아니면 사회적 구조가 이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가?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권력은 언제 뒤바뀌는가?
배가 난파된 후, 크루즈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부유층 승객들은 생존 기술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반면, 평소 하층 계급에 속했던 청소부 아비게일은 낚시와 사냥 기술을 바탕으로 생존의 중심에 서게 되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든다. 그녀는 음식과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 개념과 연결된다. 푸코는 권력이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동하며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속 권력 구조는 배 안과 섬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며, 생존이라는 환경이 기존의 계급 체계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권력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것인가? 영화는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인간은 언제 평등해지는가?
영화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조롱한다. 크루즈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승객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계급 질서가 유지된다. 반면, 무인도에서는 처음에는 생존의 필요 때문에 평등한 듯 보이지만, 결국 새로운 계급 구조가 다시 만들어진다. 이 문제는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자연 상태 개념과 연결된다. 루소는 인간이 원래 평등하지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영화 속 무인도는 문명이 사라진 공간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권력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루소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진정으로 평등해지는가? 평등은 단순한 이상에 불과한가, 아니면 실현 가능한 개념인가?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 단순한 환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4. 결론: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가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
영화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권력은 언제 뒤바뀌는지, 그리고 인간은 정말 평등해질 수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영화는 계급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권력은 언제 뒤바뀌는가, 인간은 언제 평등해지는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는 인간 사회에서 계급과 권력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평등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 있으며, 그 구조는 정말 공정한가? 영화는 이 질문을 남기며, 관객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